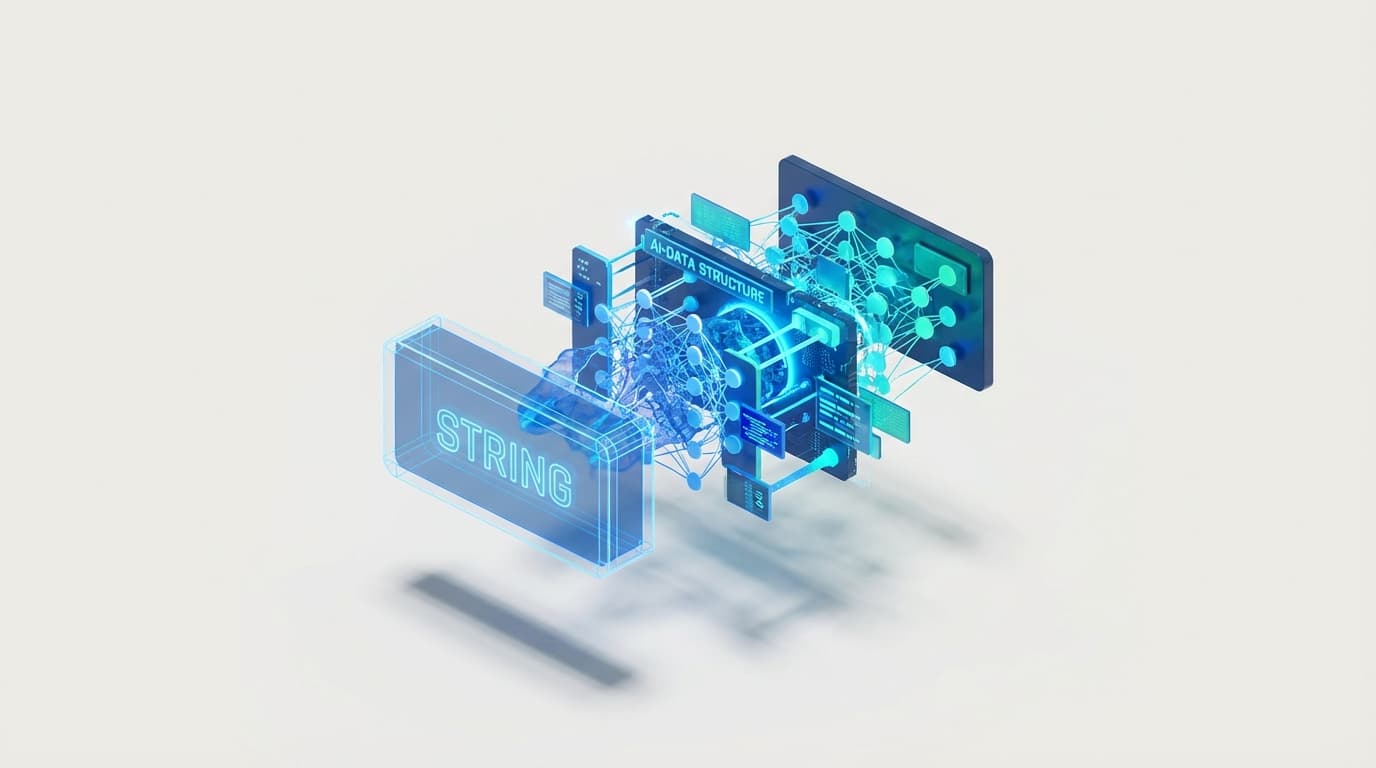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이 트위터(X)에 이미지 한 장을 올렸죠.
애플 TV+의 드라마 '플루리버스(Pluribus)' 시즌 피날레를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12년 차 디자이너로서 솔직히 말해 참담한 기분이 들더군요.
누가 봐도 '어설픈 AI 생성 이미지' 특유의 느낌이 가득했으니까요.
애플은 디자인의 디테일에 목숨을 거는 회사 아니었나요?
사람들은 당연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아티스트 키스 톰슨(Keith Thomson)에게 질문이 쏟았죠.
"이거 AI로 그린 겁니까?"
작가의 답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는 항상 손으로 그리고 칠하며, 때때로 표준 디지털 도구를 통합합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아주 교묘한 회피성 발언입니다.
'표준 디지털 도구'라는 말 속에 생성형 AI를 슬쩍 끼워 넣은 셈이죠.
재미있는 건, 이걸 두고 나오는 해석들입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고도의 전략이다. 드라마 내용 자체가 AI에 대한 이야기니, 일부러 AI스러운 그림을 올려서 메타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오컴의 면도날'을 떠올립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거창한 '3D 체스' 같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저 작가가 AI 툴을 썼고, 클라이언트인 애플을 속였거나 설득해서 납품한 것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슬롭(Slop)'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질 낮은 AI 생성물을 가리켜 '슬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돼지에게 주는 꿀꿀이죽 같은 사료를 뜻하는 단어죠.
제가 오늘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AI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아닙니다.
AI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을 콘셉트 잡을 때 자주 활용합니다.
진짜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결과물의 퀄리티'입니다.
드라마 '플루리버스'는 촬영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작품입니다.
톰슨 작가의 기존 작품들도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팀 쿡이 올린 그 이미지는, 냉정하게 말해 못생기고 어색했습니다.
예술적 의도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슬롭'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AI라는 도구의 편리함 뒤에 숨어서, 퀄리티에 대한 기준을 낮추는 것.
"AI가 뽑아줬으니 이 정도면 됐어"라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오퍼레이터'로 전락합니다.
도구가 쉬워질수록, 디자이너의 '눈(Eye)'은 더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어설픈 결과물을 내놓고 "이건 최신 기술을 활용한 워크플로우의 산물입니다"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치명적입니다.
애플 같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조차 이런 이미지 하나로 '감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프로덕트라고 다를까요?
화려한 생성형 AI 기술을 썼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우리 서비스의 톤앤매너와 맞는지,
사용자에게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를 느끼게 하지는 않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그것이 손으로 그린 그림이든, 포토샵으로 만든 것이든, 프롬프트를 입력해 뽑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아름답고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키스 톰슨이 정말 '표준 디지털 도구'로 AI를 썼다면,
그는 그 도구를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도구에 잡아먹혀 '슬롭'을 만들어낸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AI 도구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구는 거들 뿐, 퀄리티를 책임지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을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Garbage In, Garbage Out)는 말은 옛말입니다.
이제는 '검증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나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